
호모 사피엔스 Homo sapiens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1758년 스웨덴의 식물학자 린네(Carl von Linne, 1707~1778)가 현생인류의 종(種)에 붙인 명칭이다. 인류의 진화 단계를 원인(猿人: 가장 원시적인 인류), 원인(原人: 30~70만 년 전의 인류), 구인(舊人: 뇌 용량은 현대인과 다름없지만 얼굴이 길쭉하고 신장이 비교적 작은 화석인류), 신인(新人)으로 구분하는 고인류학의 관점에 따르면 호모 사피엔스는 현재 인류의 직접적 조상인 신인에 해당한다. 호모 사피엔스는 서식처에서 얻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원을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적응 양식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언어를 본격적으로 구사하고 예술 행위도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생물학에서는 현재 인류의 직접적 조상을, 철학에서는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 능력을 강조하는 단어다.

호모 파베르 Homo Faber
‘도구의 인간’이라는 뜻으로,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Henri Bergson, 1859~1941)이 만든 용어다. 도구를 사용하고 제작할 줄 안다는 점에 주목해 인간의 본질을 정의한 것이다. 베르그송은 인간이 환경에 단순히 적응하는 대신, 도구를 만들어 자신의 필요에 맞게 환경을 변화시키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원시 사회에서 인간이 돌을 깎아 창을 만들거나 나무를 깎아 집을 지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연장선상에서 앙리 베르그송은 다른 동물이나 생명체와 구별되는 인간의 특성으로 ‘지성’을 꼽았다. 지성을 바탕으로 인간은 유무형의 도구는 물론 욕망과 본능을 억제하며 스스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대사회로 접어들며 호모 파베르의 역설이 대두되고 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든 도구인 인공지능과 로봇 등이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다.

호모 루덴스 Homo Ludens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으로, 네덜란드의 역사가이자 철학자 요한 하위징아(Johan Huizinga, 1872~1945)가 던진 개념이다. 여기에서의 유희란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닌 정신적 창조 활동을 뜻하는데, 하위징아는 인간이 ‘놀이’라는 속성을 통해 문명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한다. 놀이 덕분이 사람은 완벽하게 몰두하며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이다. 하위징아가 놀이를 잃어버린 현대인이 겪을 비극을 걱정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미국의 신학자 하비 콕스(Harvey Cox, 1921~)가 말한 ‘축제하는 인간(Homo Festivus)’도 같은 맥락이다. “인간은 일상의 이성적 사고와 축제의 감성적 욕망 사이를 넘나들면서 경험과 인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문화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는 관점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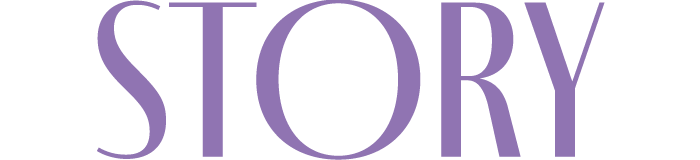
호모 나랜스 Homo Narrans
‘이야기하는 인간’이라는 뜻으로, 정보를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대신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스토리텔러(Storyteller)’를 뜻한다. 호모 나랜스라는 용어는 20세기 후반 인류학자나 문학 이론가들을 통해 널리 퍼졌다. 그리고 최근에는 디지털 공간에서 이야기를 생산하고 공유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디지털 호모 나랜스’라는 용어로 진화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짧은 시간 내에 소비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야기를 접하는 방식도다양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마케팅 분야에서 호모 나랜스에 특히 주목하고 있지만, 호모 나랜스는 수많은 분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다양한 OTT 서비스, 웹툰, 전자책 등 이야기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는 현상만 봐도 알 수 있다. 